연어·농어·대구·참치… 인간 탐욕의 희생물
양식기술 발달로 북반구서 살던 연어, 칠레에서도 서식
인기 없던 참치는 日 수출 비행기가 실어나른 후 '大인기'
퀴즈 하나. 연어 양식 2위인 국가는?(힌트: 1위는 노르웨이, 연어는 한류성 어류다) 정답은 남미 칠레다. 칠레는 수억 마리의 연어를 키우고 있다. 여기엔 비밀이 있다. 연어는 원래 북반구에서만 살았다. 연어는 적도의 따뜻한 물 때문에 남반구로 내려가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은 양식 기술을 개발했고, 덕분에 연어는 적도를 통과했다. 반세기도 채 되지 않은 일이다.
어려서 유명한 꼬마 낚시꾼이었던 저자는 커서 저널리스트가 됐고, 어느 날 바다낚시를 나갔다. 그런데 예전만큼 생선이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고 보니, 수산시장에는 과거엔 없던 생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어·농어·대구·참치. 연어는 하천, 농어는 연근해, 대구는 대륙붕, 참치는 대양에 산다. 서식지가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순서다. 저자는 이 네 종류의 생선이 지난 50년 동안 겪어온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파헤치기로 마음먹는다. 알래스카의 원주민부터 노르웨이·이스라엘·그리스·베트남을 누비며 양식업자, 과학자, 어선 선장들까지 두루 만나 취재한 결과는 과학기술 발달사이며 동시에 생선의 수난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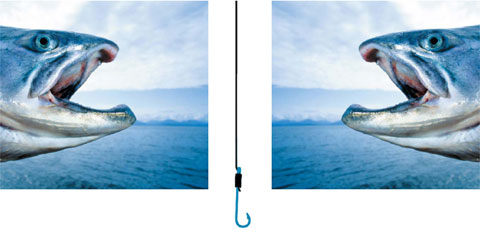
- ▲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연어 중 양식 연어는 자연산의 3배에 이른다. /게티이미지 멀티비츠
20세기 들어 생선들에게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다. 어선의 출어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팽창하면서 사태는 달라졌다. 댐에 막힌 연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농어도 남획으로 씨가 말라갔다. 물고기와 인간 수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알래스카 연어가 알래스카 주민보다 1500대 1 정도로 많은 반면 전 세계 인구는 전 세계 자연산 연어보다 7대 1 정도로 많은 것"이 문제다. 이때 등장한 것이 양식. 1960년대 전 세계적인 '녹색혁명'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에서 통일벼가 보릿고개를 해결했듯이 바다에서도 양식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생선의 양을 늘린 것.
우선 연어. 세계 각국에서 매년 생산되는 150만t의 양식 연어는 자연산 연어의 3배다. 세계인의 밥상에 오르는 연어가 양식 연어일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1960년대 초반 노르웨이의 히트라 마을에서 한 형제가 연어 치어를 피오르에 가둬 키우는 데 성공했고, 연어 양식기법은 전 세계로 퍼졌다.
그래도 연어는 알이 크고 관찰이 쉽기 때문에 양식하기에 쉬운 편이었다. 고대 로마시대부터 잔칫상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였던 농어는 사정이 달랐다. 알도 너무 작고 산란기를 조절하기도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조하르라는 이름의 이스라엘 과학자. 그는 호르몬 연구를 통해 농어의 인공사육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기법을 이용해 양식산업으로 일으킨 것은 그리스인이었다. 저자는 저명한 음식 저술가인 마크 쿨란스키( '대구'라는 책도 썼다)로부터 "인간은 대구를 잡는 어부여야지 대구를 키우는 농부가 돼선 안 된다"는 명언을 듣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참치 소비량이 급증하게 된 계기에 대한 저자의 해석도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1960~70년대 일본 전자제품의 북미 수출이 늘면서 수출품을 실어나른 비행기의 일본행 귀로(歸路)가 문제가 됐다. 어차피 빈 비행기로 돌아오느니 북미 지역에선 너무 기름지다며 인기가 없던 참치를 실어나르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일어난 참치 붐이 부메랑처럼 미국과 전 세계로 퍼졌다는 얘기다.
사람이 생선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양식으로 연어살 0.5㎏을 먹으려면 다른 생선 1.5㎏이 필요하다. 야생에서는 80%가 죽어나가는 연어 새끼를 거의 다 살려내는 양식기법은 좋지 않은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줄 위험도 있다. 가둬 기르는 데 따르는 질병과 환경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양식장에서 탈출한 생선이 새로운 유전자를 지역에 뿌려 생태계를 혼돈에 빠뜨린다.
저자는 미국 뉴욕주에서 낚시하다 낚싯바늘에 걸린 연어를 보고 잡을지 말지 망설인다. 그건 대서양 연어가 아니라 양식장에서 탈출해 자연으로 돌아온 태평양 연어였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내 "뭐 아무려면 어때"라며 연어와 낚싯대를 사이에 둔 줄다리기를 벌인다. 머릿속의 결벽주의와 온갖 논리보다 이게 차라리 인간적이다.
인간의 탐욕을 준엄히 꾸짖지 않는다는 게 이 책의 매력이다. 오히려 칼바람 부는 알래스카에서 시궁창 냄새 나는 베트남의 하천까지 두루 훑는 여행기이기도 하며, 낚시꾼의 손맛을 생생히 전하는 르포이기도 하고, 생선의 생태를 낱낱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저자는 풍부한 지식과 취재로 생선 네 종류만 가지고도 근사하고 매력적인 책을 엮어냈다. 원제는 'Four Fish'.
포 피시
폴 그린버그 지음|박산호 옮김 | 시공사|296쪽|1만3800원

조선일보 2011.06.11.
'전문기자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에는 `이` `눈`에는 `눈` (0) | 2011.06.18 |
|---|---|
| 인류의 `럭셔리` 사랑을 매도하지 마 (0) | 2011.06.11 |
| 중고 케네디 골프채가 77만 달러? (0) | 2011.06.04 |
| 영웅을 다스린 영웅, 조지 마셜 (0) | 2011.05.29 |
| 작은 선망 (0) | 2011.05.21 |




